
공순복 시집 『배내옷』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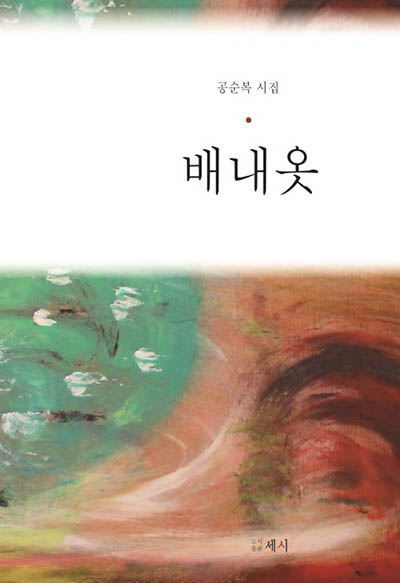
대전사람 공순복 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것은 1994년이었다. 거기서 호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은 1999년, 아마도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펜을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은 남의 동네에 껴들어가 산다는 것, 즉 이방인이요 국외자로서의 삶이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이 펜을 들어 수필과 시를 쓰게 했을 것이다. 이민을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모국어에 대한 절절한 향수가 창작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이리라. 공순복 씨는 2008년에 수필로, 2011년에 시로 고국의 문단에 고개를 내민 이후 지금까지 아주 성실히 작품을 쓰고 있다.
다른 교민들도 그러하지만 작품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제는 ‘그곳’이 된 고국에서의 삶과 추억, 그리고 ‘이곳’이 된 호주에서의 삶과 꿈이다.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뫼르소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무심하고 살인도 무심히 저지르지만 공 시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곳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있으므로. 내 젊은 날의 온갖 아픔과 슬픔, 막막함과 암담함…….
경상도 상주골 선산이
하룻길에 멀다고
아버지 생전 옥천 산비탈에
밭뙈기 하나 샀다, 하셨다
그러구러 강산이 변하기 전
아버지는 그곳에 누우시고
―「솔잎베개 돋아 고이시는」 제1연
어머니의 아코디언
펴졌다 접히길 삼십 년
나의 살던 고향 흥얼거리며
아직은 그 주름치마 꺼내 입는다
―「어머니의 아코디언」 후반부
고향이란 곳은 내 탯줄이 묻혀 있거나 부모님의 무덤이 있기도 하지만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의 온갖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특히 부모님 슬하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 어스대면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와서 회상하면 부모님의 부재로 서글픈 생각도 들고 애틋한 추억에도 잠긴다.
친정집 뒤꼍 한구석에 박혀
언제 아궁이에 들어갈지 모르는
검정 옻칠한 아버지의 서랍장
(……)
그곳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을
공부하러 서울 간 오빠 편지
족보 들어 있던 서랍 아래엔 자물쇠 달려 있어
쑥부쟁이 우리 엄마
구리무 하나 넣어 두지 못했다
―「서랍장을 머리에 이고」 부분
‘그곳’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을”이었다. “에헴!” 하는 헛기침 소리만으로도 식구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는 낡은 서랍장처럼 전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구리무’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의 일본식 말인데 ‘동동구리무’가 특히 유명했다. 이런 세계를 등지고 머나먼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내 고향의 그 무엇과 연관된다.
고향집 담장 아래 뒹굴던
초롱 닮은 물보라빛이 보이네
예전에 딸 낳으면 심었다는
오동꽃이
―「자카란다」 마지막 연
시드니 문풍지 흔들리는 날
파라마타 단풍머짐나무에
걸어놓은 뙤창을 열면
앞마당 감나무
올려다보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뙤창」 마지막 연
호주의 대표적인 꽃 자카란다를 보고 고향집 담장 아래 뒹굴던 물보라빛 오동꽃을 연상한다. 파라마타 시의 단풍버즘나무를 보고선 뙤창 너머 감나무를 올려다보던 어머니를 떠올린다. 몸은 캥거루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호주에 가 있지만 영혼의 깃발은 이렇게 고향을 향해 줄곧 휘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위대한 작품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단테는 조국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화형에 처해질 운명에 봉착, 이방을 떠돌면서 한에 사무쳐 『신곡』을 썼다. 18년 동안의 펜팔친구(프랑스 파리와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방은 너무 멀었다)인 에블린 한스카 백작부인을 보고 반한 발자크는 보고 싶어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발작적으로 소설을 썼으니 연작 장편소설 ‘인간희극(La Comédie Humaine)’이다. 소설과 편지를 쓰면서 진이 빠져 결혼 후 5개월 만에 숨을 거둔 발자크, 그 5개월도 침대에 누워 지냈으니……. 아무튼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돈오 김이다.
타닥 타닥 타다— 다 악
밤새 장작 소리 사간을 덮혀주고
새벽이 밤을 재울 때까지
펜을 놓지 않던
돈오, 재가 되어
파밀라에게 안겼습니다
―「파통가의 돈오 김」 부분
본명 김동호인 돈오 김은 호주 이민문학사를 대표하는 소설가다. 파통가에서 보트낚시를 하면서 은둔생활을 하던 그는 호주인 부인(오랜 지기였는데 사망 직전에 호적상 부부가 되었다) 파밀라와 살다가 자식도 없이 죽었다. 하지만 공순복 시인은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동인 ‘캥거루’의 일원으로 호주 교민 문단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집 『배내옷』은 호주와 한국을 연결한 일종의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물레에/ 달의 알 얹어/ 찰카닥 찰카닥 실을 잣네/ 달이 낳은 실/ 부풀어/ 새 별의 배내옷 되네”(「별의 배내옷」) 같은 시구를 보니 한국에서 필자가 보는 별과 달이, 호주에서 공 시인이 보는 그 별과 달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내옷의 그 감미로운 향기와 촉감을, 즉 어머니의 입을 통해 배운 모국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시를 쓰고 있기에 공순옥 시인은 호주의 한인 시인이자 한국의 이민자 시인이다. 그녀는 결코 이방인이나 국외자가 아니라 이 땅이 낳은 소중한 시인이다. ‘그곳’ 고국과 ‘이곳’ 호주의 거리가 꽤 멀지만 모국어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지척인 것이다.

